재즈라는 게 무언지 아직 잘 모르겠다. 서로 다른 악기 연주자가 주어진 틀 안에서 한껏 자기를 뽐내고 어우러지는 열린 음악이란 인식이 있을 뿐이다. 가끔은 그 틀조차 선명치 않게 느껴지지만 자유로움 가운데 나름의 질서와 조화가 있고 흐르는 선율 가운데 몸과 마음을 맡기기 좋은 음악이구나 여길 뿐이다. 음악에 조예가 깊지 않은 나로선 그 이상의 이해는 무리다.
그렇다고 재즈를 아예 접하지 않은 건 아니다. 찰리 파커나 마일즈 데이비스, 쳇 베이커의 음악을 이따금씩 들었고, 한국에서도 재즈바를 찾아 술 몇 잔 쯤 기울인 이력이 있다. 남들 다 보는 <위플래시>며 <라라랜드>를 보았고, 남들 잘 안 보는 <본 투 비 블루>며 <피아니스트의 전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과 <스윙걸즈> 같은 작품도 두루 챙겨보았다.
하지만 누가 '그래서 재즈를 아느냐'고 물으면 움츠러드는 게 사실이다. 재즈는 다른 대중음악과 다른, 어딘지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닐 테다. 재즈의 탄생부터 스윙과 비밥, 모던으로 이어지는 변천은 음악적 측면에선 분화와 발전이라 보아도 틀리지 않겠으나, 규모와 산업의 측면에서 보자면 번성이 아닌 쇠퇴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었다. 대중음악에 비하여 재즈를 즐기는 이들은 어디까지나 소수에 불과하며, 재즈음악계는 산업을 유지할 최소한의 소비자를 유지하는 데만도 애를 먹는 상황이다. 문턱이 높다는 불평과 한 걸음 들어서 바라보면 엄청난 매력이 있다는 평가 사이 어디쯤에 오늘의 재즈가 서 있다 봐도 좋겠다.

▲블루 자이언트포스터
판씨네마
전격적 재즈 애니메이션, 재즈로의 강제입문
<블루 자이언트>는 재즈음악이 문외한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지 않단 걸 보인다. 최고의 재즈연주자를 꿈꾸는 일본 10대 소년들의 도전기인 이 작품은 이시즈카 신이치의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한국까지 선보일 기회를 얻었다. 재즈 음악가들의 삶과 태도, 고충 따위를 기존 음악영화보다 한층 현실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와 함께, 삽입된 매력적인 스코어 만으로도 놓칠 수 없는 작품이란 평이 쏟아진다. 특히 음악을 들려줄 수 없는 만화로는 낼 수 없던 효과를 애니메이션이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이 비로소 완전해졌다고 할 수도 있을 테다.
무엇보다 작품에 들어찬 재즈 스코어를 듣고 있자면, 이 영화가 제법 긴 기간 동안 재즈영화의 명작으로 빠지지 않고 거론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적어도 재즈음악 애호가에겐 이 사실만으로 꼭 보고픈 작품이 될 것이다.
이야기는 미야기현 센다이시, 히로세가와에서 시작된다. 히로세라 이름 붙은 이 작은 강변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 미야모토 다이는 매일 같이 색소폰을 분다. 아무도 없는 강변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밤낮없이 3년 째 색소폰을 불고 있다. 그의 꿈은 세계 최고의 재즈 연주자가 되는 것이다. 세계가 얼마나 큰지, 재즈계에 세계최고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매일 성실하게 연습하며 더 나은 연주에 다가서고자 한다.

▲블루 자이언트스틸컷
판씨네마
세계최고를 꿈꾸는 청년들의 도전기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다이는 고향을 떠나 도쿄로 온다. 대학진학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도쿄를 찾아 가장 먼저 하는 일도 다른 것이 아니다. 히로세 강변을 대신할 장소를 찾는 것, 다이는 도쿄를 가로지르는 아라카와강 어느 다리 아래를 점찍는다. 그로부터 또 매일을 강변 다리 아래로 나가 색소폰을 부는 것이다.
도교에서 맞는 어느 밤, 무작정 찾은 재즈바에서 다이는 운명적 순간과 마주한다. 라이브 공연을 하는 한 재즈바였다. 무대에 선 젊은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다이를 놀라게 한다. 처음 만나는 능숙하고 화려한 기교, 다이는 곧장 그가 대단한 연주자임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다이와 그는 인사를 나눈다. 그의 이름은 사와베 유키노리,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온 실력 있는 젊은이다. 다이는 유키노리 앞에서 섹소폰 연주까지 한 끝에 그와 함께 팀을 구성해 음악을 해나가기로 결의한다.
영화는 다이와 유키노리, 드러머로 합류하는 타마다 슌지까지 세 명이 재즈 유닛 '재스 JASS'를 결성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유키노리가 쓴 곡을 연습해 조금씩 더 큰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과정이 관객으로 하여금 함께 성장하는 느낌까지 맛보게 한다. 한 번도 다른 연주자들과 합을 맞춰본 적 없는 다이, 기교가 뛰어나지만 전력으로 저만의 음악을 펼쳐본 일 없는 유키노리, 아예 초짜인 슌지가 저마다의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어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진다. 진심 어린 열망과 열정, 성실함으로 팀은 점차 단단해져 간다. 그리고 마침내는 꿈에 그리던 무대, 수많은 관객 앞에 설 기회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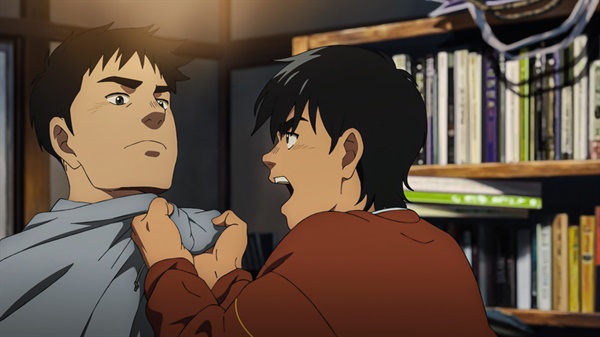
▲블루 자이언트스틸컷
판씨네마
<슬램덩크> <더 파이팅> <원피스>를 연상케 하는
개봉한 영화는 만화로 따지자면 1부 격이다. 재능과 열정이 충만한 다이가 처음으로 팀을 이루고 저의 재즈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다. 영화 중간 이미 그가 대성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지만, 영화의 본질과 결말의 이른 공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 충만한 매력으로 관객에게 다가선다. 즉, 주인공의 성공여부는 영화의 매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의 열정이, 꿈이 어떻게 실현되게 되는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영화는 제 몫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즉, 승부수는 둘이다. 음악과 감동이다.
영화는 다이가 음악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망으로 꿈에 다가서는 모습을 박력있게 그린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목표에 다가서는 걸음 또한 시행착오는 있을지라도 느려지지 않는다. 역경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역경 그 자체도 성공을 빛나게 하는 재료라는 듯 기꺼이 마주하는 태도가 놀랍다. 10대, 그 청춘의 에너지가 영화를 가득히 채운다. 동료들은 다이가 내뿜는 그 귀한 기운에 기꺼이 감화되어 그와 함께 성장한다. 영화를 보는 이들도 다이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마주한다.
누군가는 기시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형식은 음악영화이되, 꿈에 다가서는 모습은 마치 일본 청춘드라마처럼 묘사됐기 때문이다. 그저 청춘드라마인 것도 아니다. 성공을 향하여 마치 근대 무사처럼 내달리는 전형적인 일본 청춘드라마의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 대중적으로는 <슬램덩크> 류의 작품을 상상하면 그대로 맞아 떨어질 듯하다. 만약 이들에게 악기가 아닌 농구공을 던져줬다면 <슬램덩크>, 권투글러브를 쥐여주면 <더 파이팅>, 배 한 척 내줬으면 <원피스>를 찍었을 법한 분위기가 펄펄 풍겨나온다.

▲블루 자이언트스틸컷판씨네마
눈 감고 연주만 즐겨도 충만한 즐거움
주인공은 대상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움직이는 꿈 많은 청년이다. 그 열망이 너무 큰 나머지 순수한 열망만으로 모든 역경 앞에 마주선다. 그를 보는 것만으로 주변인을 감동케 한다. 뛰어난 재주를 가졌거나 성실한 노력을 거듭하는 벗들이 그 주변에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주인공에게 조력을 줄 수 있는 어른들 또한 제 때 곁에 존재한다. 주인공을 가로막는 역경은 하나하나 깨져나가고 마침내는 예정된 영광에 도달한다. 이것이 일본에서 가장 흔한 류의 성공드라마인 것이다.
물론 전형적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중을 상대로 수없이 검증돼 온 소위 먹히는 방식이며, 인간의 본래적 욕구를 저격하는 방법론인 것이다. <블루 자이언트>가 꼭 그와 같아서 영화는 가장 안정된 방식으로 보는 이를 하나하나 넘겨버린다. 오로지 열정과 성실, 실력을 통하여 말이다.
훌륭한 재즈 공연을 마주하는 듯한 스코어에 더하여 현해탄 건너까지 충분히 통하는 이야기, 무엇보다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진 영화다. 아마도 속편이 무리 없이 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이가 뮌헨으로 건너가 세계적 재즈 연주자가 되는 모습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그려질 듯하다. 그때가 되면 시리즈의 첫 편인 <블루 자이언트>를 극장에서 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재즈 팬이라면, 일본 애니메이션 팬이라면, 열망 가득한 청춘의 성공기를 즐기는 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영화다. 당신에게 <블루 자이언트>를 추천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작가.영화평론가.서평가.기자.3급항해사 / <자주 부끄럽고 가끔 행복했습니다> 저자 / 진지한 글 써봐야 알아보는 이 없으니 영화와 책 얘기나 실컷 해보련다. / 인스타 @blly_kim / 기고청탁은 goldstarsky@naver.com
최고의 재즈연주자 꿈꾸는 일본 10대 소년들의 도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