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르에도, 또 설정에도 수명이 있다. 한때 온 세상을 지배하는 듯했던 마블 시리즈가 좀처럼 흥행하지 못하는 것도, 매년 쏟아지듯 했던 좀비물이 불과 20여년 만에 크게 줄어든 것도 이를 반증한다. 대중은 무엇에든 금세 싫증을 느낀다. 아무리 잘 먹히는 공식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식상한 클리셰일 뿐이다.
흡혈귀, 즉 뱀파이어도 한때는 쌔끈한 소재였다. 브램 스토커가 15세기 루마니아 남부 왈라키아 공국의 잔인무도한 통치자 블라드 쩨페쉬에서 모티프를 얻어 드라큘라 백작을 창조했을 때, 이는 가히 혁신적인 캐릭터라 할 만 했다. 소설은 이내 영화가 되었다. 토드 브라우닝의 1931년 작 <드라큘라>는 창백한 얼굴, 붉은 입술을 가진 키 큰 사내가 순결한 처녀의 목덜미를 물어 피를 쫙쫙 뽑아 마시는 모습을 그려내 충격을 던졌다.
이후 드라큘라는 대중예술의 인기 소재로 떠올랐다. 21세기 초반 이어진 좀비물의 홍수처럼 말이다. 드라큘라가 신실하고 보수적인 삶을 살던 순결한 여성의 잠자리에 침투해서는 범해진 적 없는 새하얀 목덜미를 물고 도망치는 이야기가 수시로 영상화됐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새하얀 목덜미에 박히는 모습이 포르노그라피적 쾌감을 준다는 고백이 이어지기까지 했을 정도.

▲난 엄청 창의적인 휴머니스트 뱀파이어가 될 거야포스터
JIFF
장르적 수명을 극복하려는 시도들
그러나 드라큘라 또한 수명이 있었다. 브램 스토커의 소설과 토드 브라우닝의 영화는 한때 장르물처럼 빠르게 빛을 잃어버렸고, 저 유명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1992년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를 내기까지 수십 년의 침묵을 견뎌야 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시간의 대양을 거슬러왔소"라는 대사에 반해 빡센 오디션을 뚫어낸 게리 올드만이 당대 최고의 악역 전문 배우로 거듭났고, 키아누 리브스, 안소니 홉킨스, 위노나 라이더, 모니카 벨루치의 열연이 빛을 발했던 바로 그 작품이다.
그럼에도 따지자면 이 또한 죽어가던 드라큘라에게 잠시 숨결을 불어넣은 것에 불과했다. 쇠락한 동유럽, 그중에서도 찾는 이 얼마 없는 루마니아 남부의 빈 성터까지 가서야 만날 수 있는 드라큘라는 이미 순결도 기독교도의 폐습도 많이 사라진 현대에 이르러 거추장스런 제약만 덕지덕지 붙은 식상한 캐릭터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태어난 것이 뱀파이어다. 드라큘라란 특정 캐릭터가 가진 한계로부터 벗어나 오래 살며 다른 이의 피를 취하는 뱀파이어의 캐릭터가 확립된 것이다. 원작에서 파생된 캐릭터로써 해를 보지 못하고 마늘을 싫어하며 십자가로 심장을 찌르거나 은탄환을 맞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성격을 이어갔다. 그렇게 또 수많은 캐릭터가 나타났고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부터 <트와일라잇> 시리즈까지 가히 전성기를 구가한다.

▲난 엄청 창의적인 휴머니스트 뱀파이어가 될 거야스틸컷
JIFF
이제껏 보지 못한 뱀파이어가 왔다
그러나 그 또한 수명이 있다. 사람들은 뱀파이어에도 식상함을 느꼈다. 아무나 물고 빨면 또 뱀파이어가 되는데 세상엔 왜 뱀파이어가 얼마 없냐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다. 낮에는 나다니지 못한다는 제약 또한 세계관을 키우는 데 장애가 됐다. 그보다는 차라리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각종 좀비물이 인간세상과 엮여 더 큰 충격과 공포를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냔 비판이 쏟아졌다. 틀리지 않은 얘기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불면의 밤' 섹션에 소개된 <난 엄청 창의적인 휴머니스트 뱀파이어가 될 거야>는 뱀파이어 장르를 비틀어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을 쥐어짜낸 장르물이다. 오랫동안 불면의 밤 섹션은 장르의 전형에 빠지는 대신 그를 뒤틀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색다른 영화들을 영화팬에게 소개해왔다. 올해엔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영화 두 편이 초청돼 상영된다.
<난 엄청 창의적인 휴머니스트 뱀파이어가 될 거야>는 유독 캐나다 영화가 많이 보였던 이번 영화제의 또 하나의 캐나다 작품이다. 프랑스어를 주로 쓰는 퀘벡권 영화로, 2016년부터 단편을 발표해온 아리안 루이-세즈의 첫 장편영화다. 원제는 'Humanist Vampire Seeking Consenting Suicidal Person', 동의하는 자살자를 찾는 휴머니스트 뱀파이어다. 사람을 죽이길 원치 않는 휴머니스트 뱀파이어라니,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라니, 제목부터 전형에 젖은 장르물에 질려버린 관객을 꼬셔내지 않는가.

▲난 엄청 창의적인 휴머니스트 뱀파이어가 될 거야스틸컷
JIFF
마음 약한 뱀파이어의 고군분투
주인공은 뱀파이어 가문의 일원인 소녀 사샤(사라 몽페티 분)다. 뱀파이어니 사람의 피를 빨아야 할 텐데, 사람을 죽이기엔 마음이 너무 약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과거 드라큘라가 군림하던 시절 하급 뱀파이어는 가축의 피를 빨아 주린 배를 채우기도 했다지만, MZ세대 신식 뱀파이어는 오로지 인간의 피만 마실 수 있는 모양이다.
그녀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가족들은 그녀가 직접 사냥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한다. 사촌언니가 모범을 보이겠다며 직접 사냥감까지 골라주지만 마음 약한 사샤는 감히 시도조차 못한 채 주린 배만 움켜쥔다.
그때 사샤의 눈에 들어온 포스터 한 장, 자살자들의 모임을 알리는 공고가 적혀 있다. 자살자라니.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는 이라면 죄책감도 덜해지지 않을까. 사샤는 일말의, 그러나 간절한 기대를 품고서 모임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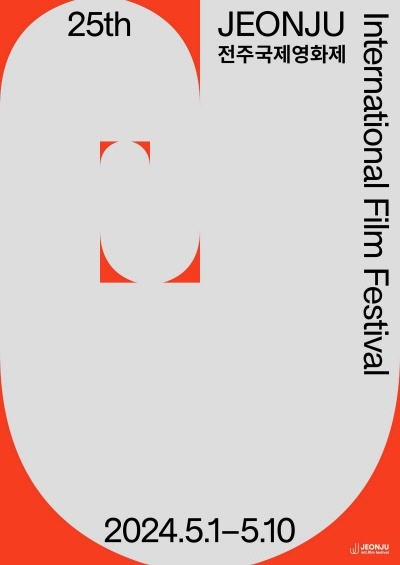
▲전주국제영화제포스터JIFF
찐 영화팬도 흐뭇하게 한 기발함
그곳에서 만난 십대 소년 폴(페릭스-앙투안 버나드 분)과 사샤는 곧장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다. 어차피 인간의 생에 별 미련이 없는 폴이다. 그의 앞에 뱀파이어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 펼쳐진다니. 그로부터 폴은 죄책감을 갖지 않고 인간의 피를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무척 많다며 사샤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광경인가. 드라큘라를 창조한 브램 스토커와 드라큘라 없는 뱀파이어 영화를 제작한 1970년대 영화인들도 이 같은 이야기는 상상해본 적 없었으리라.
한편 영화는 오랜 영화팬들에게도 충분한 호소력을 발휘할 듯 보인다. 전주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전주영화문화방'에서 오래 활약한 찐 영화팬, 이른바 '돌거북'도 이 영화를 옹호하는 이 중 하나다. 돌거북은 "사랑스러운 영화"라는 한 마디 말로 이 영화를 표현했다. 그는 "키워드로는 10대 사춘기 소녀, 우울증, 자살 등 어두울 것 같은 말을 꼽게 되지만 이를 코믹하게 잘 살려낸 점이 인상 깊었다"며 "주인공 캐스팅도 찰떡이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영화로부터 특별히 떠오른 몇 편의 작품을 따로 언급하고 싶다고 전했다. 돌거북은 "현대를 배경으로 한 뱀파이어 영화이면서 감각적인 비주얼을 보여준 <밤을 걷는 뱀파이어 소녀>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 짐 자무시의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 살아남는다>도 함께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10대 소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틴에이지 뱀파이어>가, 좀비물임에도 기존 장르와 이질적으로 통통 튀는 발랄함을 더한 <웜 바디스>도 떠올랐다"면서 "뱀파이어 호러의 클리셰를 일부러 차용하면서 주인공이 가진 특수성과 부딪히는 장면들이 재밌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작가.영화평론가.서평가.기자.3급항해사 / <자주 부끄럽고 가끔 행복했습니다> 저자 / 진지한 글 써봐야 알아보는 이 없으니 영화와 책 얘기나 실컷 해보련다. / 인스타 @blly_kim / 기고청탁은 goldstarsky@naver.com
사람 못 죽이는 흡혈귀, 자살자 모임에 참석한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