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이 마흔인 우리 나잇대(69년생)는 유사 이래 가장 편안한 세대 같다. 일제와 한국 전쟁의 혼란을 넘은 시대에 태어나 유신 독재를 피했다. 물론 87년 민주화 운동시대를 겪었지만 전쟁과 혼란, 외세의 침입에서 자유로우면서 배고픔을 면했던 세대가 유사 이래 언제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수긍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평안한 시대의 후반이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사는 베이징이나 한국이나 시시각각 내리치는 번개와 벼락은 영화 <투모로우>에서 보여준 파괴의 전주곡을 상상하게 한다.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로 풀이되는 문화간의 충돌은 '샘물 교회' 납치 사건과 같이 우리에게도 먼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사실 이 사건은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충돌이면서 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미국과 방어하는 아랍세력간의 끝없는 충돌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악의 축'으로 매도되는 '북한'과 '아랍'이라는 두 곳에 작가 황석영이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런던탑을 배경으로 서 있는 한 소녀를 표지로 한 소설 '바리데기'는 그런 작가의 처절한 절규이자 염원의 메시지 등을 담고 있다.
더 넓어진 황석영의 귀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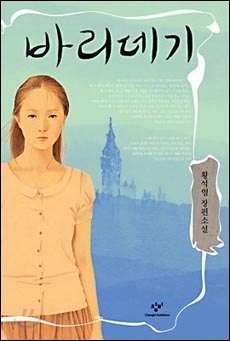 | | | ▲ 황석영 신작 <바리데기> 표지 | | | ⓒ 창비 | 좋은 작가가 있다는 것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축복이다. 물론 후대에도 축복일 것이다. 일본소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요즘에 기존 작가들은 맥을 추지 못한다. 더러는 4~5년째 신작집을 내지 못하는 작가가 수두룩하고, 책을 낸 작가들도 기존처럼 책이 팔리지 않는다. 이것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흘러 한국 문단은 서서히 퇴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 정도다.
작가의 고통은 영(靈)은 사라지고, 물질과 사이버만이 혼돈하는 시대에서 기인한다. 그 시대로 들어가기에 작가들은 너무 늦은 탓에 겉에서 부유한다. 사이버 문화의 1세대(기자는 96년 나모웹에디터로 개인 홈피를 만들어서 몇 개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에 들어가는 기자 역시 혼돈스러운 용어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영매들을 통해 글을 만드는 작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너무 힘들다. 그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주저앉는 게 요즘 작가들이다.
이런 세상을 헤쳐갈 힘은 사실 용기와 미래를 보는 통찰이다. 황석영의 이번 소설 <바리데기>는 그런 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는 소설이다. 그의 이번 소설은 그의 가장 소중한 소재를 가장 넓게 펼쳐낸 걸작이기 때문이다.
기자가 황석영을 실제로 본 것은 98년 가을 임진각에서다. '한겨레 통일굿'에서 그는 김금화 만신의 상대로 보일 만큼 그 굿에서 박수 역할을 했다. 그에게는 무당과 같은 기운이 있었고, 그것을 소설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풀어냈다.
이후 다양한 통로로 황석영에 대한 일을 들었고, 6개월 전쯤 종로구 운니동 골목을 걷다가 빗겨 지나간 적이 있다. 물론 나만이 황석영을 알 수 있는 관계니 그냥 스쳐 지나간 것뿐이다.
하지만 <바리데기>를 읽으면서 작가의 세계가 이제 가장 큰 곳까지 펼쳐져 있음에 놀랐다. 소설은 한국 무가(巫歌)의 대표적인 스토리인 '바리데기'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소재가 한국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택한 것 같다.
사실 소설은 심플한 것 같지만 가장 궁극적인 황석영의 사상관이 모두 담겨져 있다. 무속, 기독교, 불교 등 우리 종교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인해 현 시대 '악의 축'으로 불리는 북한과 아랍을 정면으로 주시하기 때문이다.
찾을 수 없는 생명수에 대한 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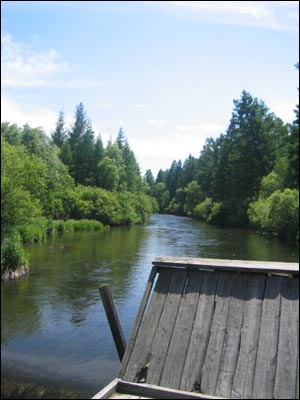 |  | | | ▲ 바리가 건넜을 법한 변경. 숭선의 옆에 있는 두만강 변. 일명 김일성 낙시터 | | | ⓒ 조창완 | 소설의 주인공 바리는 1983년 북한 청진에서 딸부자집의 7째로 태어났으니 지금 25살의 여성이다. 어렵긴 했지만 아버지가 철광도시 무산시의 부위원장까지 지낸 만큼 어린 시절은 다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부정으로 걸리면서 12살 때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바리는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온다.
이후 발마사지를 배우면서 따리엔을 거쳐서 영국으로 건너간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랍인 알리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알리가 아프칸에 간 사이 딸 순이를 낳았다가 잃는 교통을 겪는 것까지가 이야기의 전부다.
어렸을 적 '무병'을 앓아서 과거를 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샤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운명은 볼 수 없는 바리가 테러의 혼란 속에서 신음하는 런던의 한 거리에 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소설은 서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던질 수 있는 작가의 가장 큰 이야기다.
그녀가 간 여정은 소설 같기도 하지만 실제이기도 하다. 기자가 사는 베이징의 북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바리와 같은 또래의 여성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 물론 그녀들은 바리와 달리 좋은 성분을 가진 여성들로 평양에 가족을 둔 이들이 대부분이다. 또 이제는 많이 줄었지만 대학에 가면 북한 유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실 그들이 지닌 혼돈과 정체성을 생각하면 나조차도 머리가 복잡해질 정도지만, 사실 그들은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 안쓰러울 정도로 심한 화장과 통제된 생활, 보통 3년만의 복귀가 그들의 생활이다.
작가는 샤먼인 바리가 무속신화에서처럼 생명수를 구하기 위해 험난한 길을 가는 모습을 그려낸다. 하지만 죽음을 건너서 찾아간 곳에서 생명수를 구할 수는 없다. "사람들의 욕망 때문이래. 남보다 더 좋은 것 먹고 입고 쓰고 살려고 우리를 괴롭혔지. 그래서 너희 배를 함께 타고 계시는 신께서도 고통스러워하신대"라는 말은 인간 세상에 생명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다.
"힘센 자의 교만과 힘없는 자의 절망이 이루어낸 지옥"을 이겨내는 생명수는 무엇일까. 작가는 '악의 축'으로 불리는 북한과 아랍의 진실성을 펼쳐 보인다. 물론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선이라는 등의 엉뚱한 내용이 아니다.
우선의 바람은 이 책이 빨리 영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 영성(靈聖)의 메카를 자초하는 우리 종교 등 사상계가 정녕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다.
 | | | ▲ 비교적 여유로운 단둥 맞은 편 신의주의 북한 주민들 | | | ⓒ 조창완 |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chogaci)에도 실렸습니다.
|
|
바리데기
황석영 지음, 창비(2007)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