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맞춤법이 왜 그렇게 어렵냐고 하소연하는 주변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럴 때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한다. 국어 시간에 우리말 맞춤법 교육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학교에 근무할 당시에는 맞춤법 교육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우리말 맞춤법과 대학 입시가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한번쯤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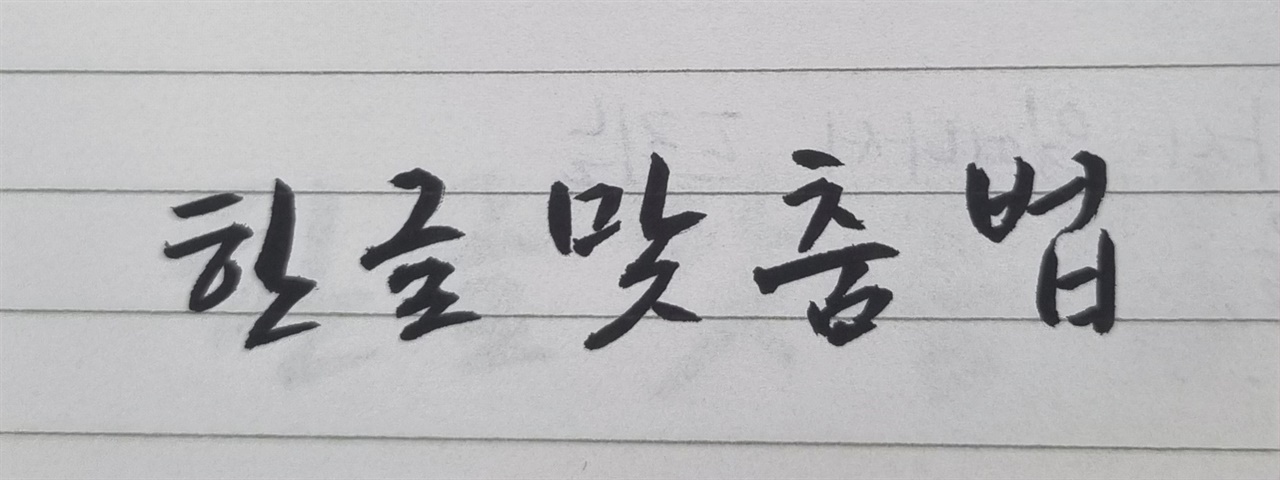
|
| ▲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는 게 누워 떡 먹기처럼 쉽지는 않다. 헷갈릴 때마다 사전을 찾아보는 게 좋다. |
| ⓒ 이준만 | 관련사진보기 |
주변 사람들이 맞춤법에 대해 자주 묻는 것들 중 하나가 '깍두기'가 맞느냐 '깍뚜기'가 맞느냐와 '딱다구리'가 맞느냐 '딱따구리'가 맞느냐이다. 어떤 사람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로 소리대로 적'어야 하므로 '깍뚜기', '딱다구리'가 맞는 표기하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각각 '[깍뚜기]', '[딱다구리]'라고 소리가 나므로 그렇게 적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국어 교사로 퇴직한 나도 가끔 헷갈린다. 이럴 때 한글 맞춤법 제5항과 제13항을 떠올리면 매우 도움이 된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5항은 한마디로 '된소리로 나면 된소리로 적어라'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만'의 규정이다. 제5항의 '다만'에서는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이 제5항 '다만'의 규정에 따라 '깍두기'는 '[깍뚜기]'라고 된소리로 소리 나지만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깍두기'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또 제5항 '다만'의 규정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므로, 'ㄱ, ㅂ' 받침 뒤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면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이는 한글 맞춤법 제13항의 규정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딱따구리'라고 적어야 맞는 표기이다. 'ㄱ' 받침 뒤에서 '딱'과 비슷한 음절인 '따'가 겹쳐 나기 때문이다. '깍두기'와 견주어 보면 차이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깍]'과 '[뚜]', '[딱]'과 [따]'를 견주어 보라. [깍], [뚜]에 비해 [딱], [따]가 훨씬 비슷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깍두기'라고 적어야 맞춤법에 맞고 '딱따구리'라고 적어야 맞춤법에 맞는 표기가 된다.
제1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억해 놓으면 좋을 단어들이 몇 개 있다. 맞춤법이 헷갈릴 때 매우 요긴하리라 생각한다.
딱딱 쌕쌕 씩씩 똑딱똑딱 쓱싹쓱싹 싹싹하다 쌉쌀하다 씁쓸하다 짭짤하다
자칫 두 번째 음절을 된소리로 적지 않은 실수를 범하기 쉬운 단어들이다. 제5항 '다만'에서 규정한 것처럼 'ㄱ, ㅂ 받침 뒤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니,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기억해도 좋고, 제13항의 규정처럼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라고 기억해도 좋다. 잘 기억해 놓았다고 글 쓸 기회가 있을 때 적절히 활용하면 어떨까 싶다.
기억해야 할 양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깍두기'와 '딱따구리'가 맞춤법에 들어맞는 표기인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기억했다가 유사한 사례에 적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 기억해야 할 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되,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면 된소리로 적는다.
어떤 사람들은 단어 하나하나의 맞춤법이 뭐 그리 대수냐고 말하기도 한다. 어차피 문장 안 맥락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알 수 있지 않느냐면서. 물론 '깍두기'라고 적든 '깍뚜기'라고 적든 글쓴이의 의도가 왜곡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
하지만 맞춤법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속을 잘 지켜 맞춤법에 맞게 언어생활을 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곳에서 맞춤법을 잘 지킨 깔끔한 글들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또 쓸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라도 맞춤법에 어긋난 곳이 여기저기에서 보이면 글 내용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나, 글의 신뢰성 차원에서나 글을 쓸 때 맞춤법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