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닌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흔하지 않다. 보통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익숙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사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다. 힘든 일이기 때문이겠지만, 그럴 기회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삶을 25년 동안 살펴보고, 그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일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조은 명예교수의 책 <사당동 더하기 25>는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다. 무엇보다 관심 가질 부분은 2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누구를', '무엇을 위해' 관찰했느냐는 것이다. 이 책에선 '가난'과 '삶'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을 볼 수 있다.
사당동에서 만난 할머니네 가족, 25년을 관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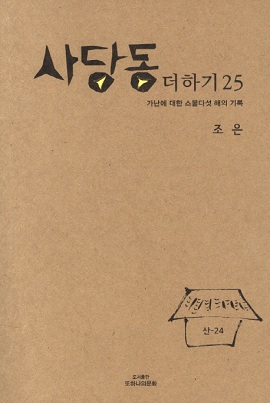
▲ 책 <사당동 더하기 25> 표지 사진 ⓒ 또하나의문화
<사당동 더하기 25>는 1986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철거가 예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관찰하며 연구하기로 한 것이다. '달동네'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는 어느 할머니 가족을 집중해서 연구한 것이 책의 내용이다.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순간, 겨우 임대주택에 들어서는 과정,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낮은 학력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슬픈 광경까지. 저자는 '가난'이 보여주는 맨얼굴을 인터뷰와 관찰기로 덤덤하게 담았다.
가족사를 정리하면 조부 대에서는 소작농이었고 부모 대에서 여관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사회 이동의 가능성을 얻었지만 할머니 본인 대에 와서 한국 전쟁과 월남 피난민이 되면서 노점상과 일용직의 도시 빈민이 되었다. 할머니 시가의 경우를 보면 할머니의 시조부는 빈농이었고 시아버지는 이발 행상을 하다 여관 숙박업을 했고 남편은 그러한 여관집 아들이었으나 월남하면서 다시 이발 행상, 아들은 일용직 건설 노동을 하는 영세민이다. 큰손자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다.
계급 재생산과 관련하여 가계도를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계급이나 계층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빈곤 재생산의 삶과 과정은 좀 더 복잡다단하다. (본문 29쪽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생존을 위해 미래를 꿈꾸지 못하던 금선 할머니네 가족이 '임대 주택'을 통해 주거 문제가 해결되자 꿈을 찾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수일 아저씨는 이주 여성을 아내로 데려오고 자녀들은 운동선수 등 삶의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
'카메라가 없어서' 가족사진조차 없던 그들

▲ 다큐멘터리 <사당동 더하기 22> 중 한 장면. ⓒ 조은
할머니, 아저씨, 자녀들 사진은 각각 있지만 모두 모인 가족사진은 보이지 않는 집. 이유를 묻자 '카메라가 없어서'라고 답하는 사람들.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진 오늘날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가난해서 가족사진조차 가질 수 없던 시절과 사연이 본문에서 고스란히 전해진다.
흙집으로 겨우 증축한 건물에서 수십 가구가 모여 살고, 2층엔 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1층으로 내려와 씻어야 하는 주택. 한 건물에 여러 가족이 살아서 전기 사용으로 시비가 붙는 날들. 한 방에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사느라 개인사가 보장되지 않는 삶. 오늘날 한국에서는 차마 상상하기도 힘든 풍경이다. 때로는 정겹고 때로는 처참한 삶이 당시 현장에 방을 얻어 살던 조교들의 시선으로 차곡차곡 적혀있다.
1980년대 말, 급변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사당동에 이사 온 학생들'이 간첩으로 오해받은 상황은 웃기면서도 황당하다. 철거민을 관찰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살기로 한 남녀 조교들을 의심한 동네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1986년 10월 19일 홍경선 조교의 현장 일지에는 "이틀 전부터 관악경찰서에서 형사가 찾아왔었는데, 오늘 아침 관악경찰서 대공과에서 연락이 와 혜란 누나(여학생 조교가 나이가 위여서 이렇게 부름)와 같이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조사받은 내용 중에는 "대학원생이 논문을 쓴다고 들어와 조사를 한다며 북어 뜯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남학생은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며 보증금 40만 원에 월세 4만 원에 방을 얻어 들어와 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는 조사원의 말도 적혀 있다. (중략)
동네 곳곳에 간첩 신고 포상금이라든가 '수상한 사람 신고하기' 포스터가 붙어 있었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간첩 의심 신고를 열심히 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조교들이 불려 가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세 번이나 불려갔다. 놀랍게도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부부 위장 간첩 신고를 한 것이다. (본문 52쪽 중에서)
가난에 대한 고찰 담긴 책
<사당동 더하기 25>는 당시 사당동을 떠난 철거민 중 금선 할머니네 가족을 추적한 책이다. '도시빈민'이나 '불량 주거지'라는 단어로 쉽게 전달하기 어려운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폭넓게 묘사한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삶의 수준이 괜찮은 '관찰자'들이 '관찰 대상'과 인간적인 관계를 쌓아가면서 겪는 고뇌도 드러난다.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금선 할머니네 식구와 적절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들이 궁핍한 상황에 처하면 도와주려고 노력한 부분도 보인다.
사당동 철거 지역에서 상계동 임대 아파트 단지까지 서울 빈민들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특히 한 가난한 가족을 25년간 계속 따라다니면서 '가난함'이란 무엇일까, '빈곤 문화'란 어떤 것일까, 이들에게 빈곤의 출구는 있을 것일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 보았다. (본문 271쪽 중에서)
생존을 위해 맨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와중에 빚과 싸우면서 노동하는 이야기들.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 애쓰지만 빠져나오지 힘든 가난의 늪. <사당동 더하기 25>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씁쓸하게도 그런 것들이다. 어쩌면 '빈곤 문화'가 가난의 이유인지 결과인지 묻는 부분이 어쩌면 책의 핵심인지도 모르겠다.
책의 소재가 된 1980년대 당시 한국에서는 1986년 아시안 게임, 1987년 노동자 대투쟁, 1988년 서울올림픽이 벌어졌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급변을 거듭했다. 철거 재개발 이슈를 이제 사그라든 역사로 봐야할까? 연구 과정이 영상으로 정리되어 다큐멘터리 영화 <사당동 더하기 22>가 나왔던 시기는 <사당동 더하기 25>의 출간에 3년 앞서 용산 참사가 있던 2009년이었다. 이 책이 지적하는 빈곤과 공간, 세대에 걸쳐서 끊을 수 없는 가난의 문제는 2016년 한국에서도 여전히 '더하기 29'로 쌓여가는 건 아닐까.
사당동 더하기 25 -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조은 지음,
또하나의문화, 2012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