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맨유 가고 나서부터 축구 본 주제에...'라는 우스갯소리를 보았다. 2005년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기 전부터 해외 축구를 본 사람들이 거들먹대기 위해 쓰던 말이었다고 한다. 나는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던 2010/2011 시즌부터 해외 축구를 보기 시작했다.
이 즈음부터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아크로바틱 같은 골을 여러 차례 터뜨린 로빈 판 페르시가 떠오른다. 세르히오 아구에로, 루이스 수아레스, 모하메드 살라 등 당대 최고라고 할 만한 공격수들이 득점왕에게 수여되는 '골든 부츠'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토트넘 핫스퍼에서 손흥민과 함께 '손케 듀오'를 이루고 있는 해리 케인은 세 번의 득점왕을 차지했다. 이때 보았던 득점왕들은 범접할 수 없는 '별'처럼 느껴졌다. 차범근 같은 선수가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아시아 선수가 이만한 족적을 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리그는 장기 레이스다. 어떤 리그든 득점왕을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10개월 가까이 펼쳐지는 다회의 라운드 동안 꾸준한 활약을 펼쳐야 한다. 많은 골을 기록했지만, 경쟁자가 더 많은 골을 넣어서 고배를 삼킬 수도 있다. 장기 부상 역시 없어야 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득점 2위이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인 웨인 루니조차 득점왕 기록이 없다.
패스, 또 패스... 동료들이 선사한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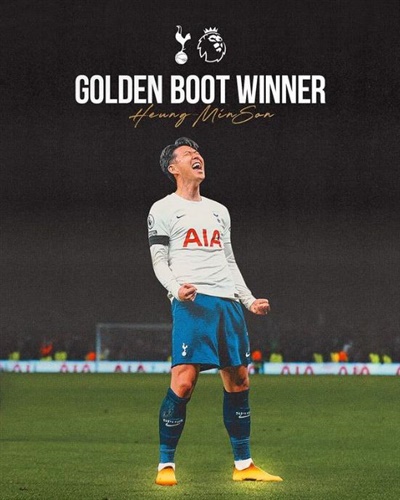
▲EPL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한 '손세이셔널' 손흥민(30·토트넘)은 "믿을 수 없다"며 감격했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 2021-2022시즌 EPL 최종 38라운드에서 2골을 몰아치며 토트넘의 5-0 대승에 힘을 보탰다.(토트넘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지난 5월 23일, 손흥민이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 득점자(35경기 23골)가 되었다. 같은 날 1골을 추가한 리버풀 FC의 살라와 함께 공동 1위다. 손흥민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리그 최하위인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리그 22호, 23호 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승리,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이끌었다. 손흥민 특유의 환상적인 감아차기 골로 득점왕이 확정되었다. 이날 손흥민은 유럽 5대 빅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로 기록되었다. 손흥민의 우상으로 손꼽혔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8골, 리그 득점 3위)마저 제쳤다.
특히 리그 우승팀과 챔피언스 리그 진출팀, 득점왕이 동시에 일제히 결정되는 마지막 라운드는 드라마 각본 같았다. 손흥민이 득점 1위인 살라를 턱 끝까지 추격하는 상황이었다. 노리치 시티의 팀 크룰 골키퍼가 연이어 손흥민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팬들은 가슴을 졸였다. 손흥민이 두 골을 추가한 이후 경기 종료를 10여 분 남겨둔 상황, 살라의 추가 골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다른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다.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을 차치하고도, 이 상황성과 맥락이 만드는 감동은 컸다.
토트넘 동료들의 이타주의 역시 감동을 주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이후, '찬스를 연이어 놓치면서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동료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 주었다. 찬스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해주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토트넘의 동료들은 손흥민에게 공을 주는 것을 최우선시했다.
단짝 해리 케인은 끊임없이 손흥민을 향해 양질의 패스를 공급했다. 타이밍 좋은 패스가 장기인 쿨루셉스키는 자신에게 주어진 득점 찬스를 일부러 손흥민에게 양보하다가 몸의 중심축이 무너지기도 했다. 손흥민의 리그 22호 골을 도운 루카스 모라는 손흥민이 추가 골을 넣었을 때 그를 번쩍 들어 올렸다. 이미 승패는 일찌감치 결정된 상황이었지만, 동료들은 자신이 득점왕이 된 듯 기뻐했다. 지난 7년 동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음에도, 손흥민이 재계약을 선택한 것이 이해되는 팀 분위기였다.
다사다난한 소설의 끝, 아름답게 장식하다

▲EPL 득점왕 손흥민 "6만 관중 속에도 태극기는 유독 잘 보여"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빛나는 손흥민(토트넘)이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6만 명의 관중 속에서도 유독 태극기와 한국 분들의 얼굴은 참 잘 보인다"며 "매번 마음이 가득 차는 기분이 들면서 큰 힘이 생기는 것 같아 신기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골든 부트'(득점왕 트로피)를 들고 포즈 취하는 손흥민. (손흥민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이번 시즌은 시작과 동시에 위기였다. 조세 무리뉴 감독의 경질 이후, 여러 감독이 물망에 올랐지만 무산되기를 반복했다.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은 토트넘을 중하위권 팀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이때만 해도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비관하는 팬들이 대부분이었다. 11월, 이탈리아 출신의 명장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콘테 감독은 불안한 수비 조직력 등 팀의 문제점을 빠르게 진단했고, 떨어지고 있던 순위는 조금씩 반등했다.
특히 겨울 이적시장에서 영입된 2000년생 윙어 데얀 클루셉스키는 손흥민에게 다섯 골을 선물하는 도움왕이 되었다. 손흥민은 이들과 함께 팀의 반등을 이끌었다. 득점 1위인 모하메드 살라와의 차이를 조금씩 좁혀 나갔고, 시즌 최후반기에는 10경기 12골을 기록했다. 24라운드에서 살라(19골)에게 8골 차로 뒤져 있었던 손흥민(11골)은 동률(23골)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놀라운 여정의 완성이다.
많은 축구 팬들이 그렇듯, 나도 손흥민의 여정을 오래 전부터 지켜보았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뛰던 10대 시절, 골키퍼 앞에서 공을 공중으로 띄운 후 넣었던 데뷔골,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 토트넘 입단 초기 '실패한 영입'이라며 비난 받던 모습도 기억한다. 군대에서 토트넘의 경기를 보다가, 그가 추가 시간에 교체 투입되는 모습을 보며 속상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안주했던 적이 없다. 오히려 매 시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시즌 리그에서 17골을 터뜨리면서 프리미어 리그 베스트에 뽑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전성기마저 넘어서 유럽 최고의 골잡이 중 하나가 되었다. '손흥민의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는 모르겠다. 현재진행형 전설의 여정을 있는 그대로 즐기기만 해도 좋을 것이다.
☞ 관점이 있는 스포츠 뉴스, '오마이스포츠' 페이스북 바로가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대중 음악과 공연,영화, 책을 좋아하는 사람, 스물 아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