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주씨는 생활격리시설에서 방호복을 입고 할머니를 돌봤다. 노조는 그가 입은 방호복이 의료진의 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
| ⓒ 주승민씨 제공 | 관련사진보기 |
"코로나 양성 판정 나왔습니다. 대기하고 계세요."
주승민(가명·50대)씨는 귀를 의심했다. 1월 19일 오전, 보건소에서 온 전화 한 통은 그의 일상을 '멈춤' 상태로 만들었다. 곧이어 119 구급차가 도착했다. 주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로 방호복을 입고 서울의 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8일 현재 9일째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주씨는 기자와 통화 중에도 1분에 6~7차례 기침을 이어갔다.
열은 없었지만 뼈 마디마디가 시렸다. 옷을 겹겹이 입었는데도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불면의 밤이 이어졌다. 주씨는 "코로나는 열이 난다고 들었는데, 나는 매일 발열체크를 해도 정상체온이었다"면서 "코로나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감기약을 먹었다"라고 말했다.
강은미(가명·50대)씨는 주씨와 달리 별 증상이 없었다. 그는 주씨와 같은 날인 1월 19일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았다. 지난 1월 28일 통화한 강씨는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있는데, 아직까지 특이 증상은 없다"면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가슴 통증이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밀접접촉자 돌보다가 감염되다
증상은 달랐지만, 강씨와 주씨는 같은 공간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 소속의 요양보호사다. 앞서 서울시와 서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긴급돌봄 사업'을 올해 초에 시설 코호트 격리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요양병원에까지 확대했다.
강씨와 주씨도 긴급돌봄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5일 서울시 생활격리시설인 명동의 한 호텔에 입소했다. 입소 전,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돌봐야 하는 대상은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들로 상대를 감염시킬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인 강씨와 주씨도 돌봄 기간인 14일 동안 외부로 나갈 수 없었다.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남은 시간은 호텔방 안에서 보내야 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온 80대 할머니를 담당했다. 강씨는 오전 1~10시까지 하반신이 마비된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챙기고 종종 마사지도 했다. 주씨는 오전 9~오후 6시까지 담당 할머니를 돌봤다. 방호복에 두 겹 장갑을 끼고 덧신도 신으며 지침을 따랐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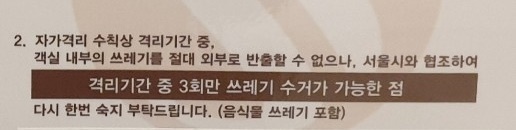
|
| ▲ 생활격리시설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방 안에 보관하라면서, 쓰레기는 격리기간(14일) 중 3회만 수거해 간다고 했다. |
| ⓒ 강은미씨 제공 | 관련사진보기 |
강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어떻게 감염된 걸까' 생각하다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보건소는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 상태였던 할머니로부터 강씨가 감염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강씨가 담당했던 할머니는 격리기간 동안 자연 치유된 것으로 추정했다. 돌봄 대상은 달랐지만 주씨도 그가 담당한 할머니에게 감염됐다.
"어느날부터인가 (할머니가) 자꾸 왼쪽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어깨가 아프다고도 하고...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고 힘들어 했어요. 이런 증상이 일주일 동안 지속됐는데, (생활격리시설 담당자에게) 보고해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열이 없으니까 코로나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어 강씨는 '방호복'을 언급했다. 그는 "할머니가 코로나 확진이었으면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본 내 방호복에도 바이러스가 묻지 않았겠느냐"면서 "그 방호복이 방안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서도 방호복 처리과정을 듣더니 (처리가) 아쉽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분명 방호복 입었는데... 어떻게 감염된 것일까
사실 강씨와 주씨는 사전에 교육받은 대로 방 안에 들어가기 전 방호복을 벗었다. 생활격리시설은 '방 밖에서 방호복을 벗고 지급한 쓰레기 봉투에 방호복을 모았다가 배출일에 내놓으면 된다'라고 했다. 쓰레기 봉투는 방 안에 보관하라고 했다. 쓰레기는 격리기간(14일) 중 3회만 수거해 갔다.
"방호복이 의료 폐기물이잖아요.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건 매일매일 버려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4일에 한 번 방호복을 수거해 갔어요. 방호복을 담을 봉지는 한 개뿐이었고요. 다음 날 방호복을 버리려면 그 봉지를 열고 겹겹이 (방호복을) 쌓아야 했죠. 이걸 방 안에서 했으니 그 때 바이러스가 묻어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강씨는 "뒤늦게 방호복의 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서사원) 노조로부터 들었다"라고 부연했다. 그가 착용한 방호복이 코로나 전담병원의 의료진이 착용하는 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제품이었다는 것.
서사원 노조관계자는 "(요양보호사들이 착용한) 방호복은 체액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침투저항성 시험에서 2~3등급 판정받은 제품이 아니라 액체투과 시험(ISO5630)만 통과한 것이라 (2~3등급 방호복보다)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방어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방호복의 질을 문제 삼았다.
어제까지 입안이 텁텁하고 혀끝이 맛을 못 느꼈는데 , 오늘은 조금 나은거 같다. 기침하고 가래는 여전하다. 하지만 이 또한 모두 지나가리.
- 1월 23일 주씨의 일기 중에서
앞서 잦은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는 주승민씨가 쓴 일기의 한 부분이다. 주씨는 1월 28일 생활치료센터 의사에게 "바이러스 수치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다. 기침도 멈추지 않고 있다. 집에 돌아가면 90세가 넘은 시아버지가 있어 주씨 역시 생활치료센터에 더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여기(생활치료센터)는 수용소 같다,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몸이 불편하고 약해지니까 자꾸 기분이 우울해진다"라고 말했다.
"제가 돌본 분들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오셨잖아요. 할머니들이 생활격리시설에 입소할 때는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잠복기가 지나면 양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할머니가) 무증상이었어도 중간에 코로나 검사를 한 번 더 받게 했어야죠. 할머니들이 설사하고 아프다고 해도 코로나 증상이 아니라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생활격리시설의) 무책임한 대응 때문에 제가 코로나에 감염된 거 아닌가요?"
주씨가 마른 기침을 하며 되물었다.
한편, 서사원 관계자는 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방호복의 질이나 의료폐기물 수거 관련해서는 역학조사관의 추정일 뿐이라 이를 통해 감염됐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요양보호사의 코로나 확진 후) 의료폐기물 수거는 1일 1회 하는 것으로 시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서 온 어르신들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만큼 앞으로 이 어르신들을 생활격리시설이 아닌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이송하려 한다"라고 덧붙였다.